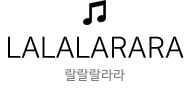| 마음먹어야 여유를 담을 수 있다
어릴적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운전에서 피곤함을 느끼던 아버지는 도로가에 외진곳에 차를 세워두고 한숨 잠을 주무시곤 하셨는데, 그럴때마다 시골 밤길은 참 호젓하게 아름답고도 무서운 느낌이었다. 온 사방이 고요한데 꼭 개구리인지 두꺼비인지 알수없는 양서류가 줄기차게 울어대고 무서운 마음보다 지루한 시간에 지쳐갈때 즈음이면 차에서 조용히 내려 몇발자국 내딛지 못하고 두리번거리다가 결국 시야가 머무는 마지막 종착지는 밤하늘의 별이었던 기억.
그렇게 자연스럽게 항상 볼수있던 별이었는데 요즘들어서 밤 하늘을 올려다보질 않게되었다. 가평이나 춘천등에 펜션을 잡고 휴가를 떠나는 여름이 아니고서는 밤하늘을 마주하지 않게되는것을 보니. 아마도 일년에 한두번정도 밤하늘을 보나 싶어진다.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때면 늦은시간에 츄리닝 차림으로 슬리퍼를 끌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편의점으로 향해 캔맥주를 사고 아무도 없을것 같지만 위험하지 않을것 같은 조용한 벤치에 앉아서 혼자 꼴짝꼴짝 맥주를 삼키지만 가로등 아래에서는 밤을 즐길수가 없고 마음이 풀리지도 않는다. 불빛 아래에서는 별을 볼수도 없고, 하루살이와 피냄새를 맡은 모기들이 금방 달라들어서 내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기도 전에 엉덩이를 탈탈 털고 일어서게 되니까.
별똥별 세개가 떨어지는 순간
| 25" F2.8 ISO3200
사실 힘든 상황을 버텨야하는데 일분일초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의 시간보낼만한 꺼리가 필요해서 나선것이 더 솔직한 마음이었다. 누구와도 말섞고싶지 않고 그렇다고 마냥 혼자있기에도 시간이 버거울 때. 애초에 삼각대라던가 플래시나 뭐 그런것들이 있지도않고. 사진도 마음가는대로 셔터만 눌러대는 정도이기 때문에 딱히 별사진을 내가 담을수 있겠구나 같은 기대는 없었다. 마냥 떠나는데 카메라도 들고 가지 않으려니 허전한 기분이 들어 어깨에 메고 나왔는데 새벽 내내 밤하늘 아래 서서 쏟아지는 별을 보고있자니 나도모르게 카메라를 만지작거리고있었다
1초에도 수없이 떨어지는 별똥별들이 떨어지는데 소원하나 빌지 않았다. 나이먹고 순수성이 떨어져서라기 보다는 마음에 그정도 여유조차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만큼 추운 새벽 갈곳없이 예정된 시간까지 그 별하늘 아래서 버텨야하는 강제성, 그 상황에서 나도모르게 내가 할수 있을만한 거리를 찾아서 시간을 버티면서 카메라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손가락. 삼각대 대신 차가운 시멘트바닥 위에 내려놓고 셔터를 누른채 기다렸다 장비도 없는 상태로 혹시나 우연을 얻을까 싶은 기대심에.
그래도 다행이었다. 아직은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탄할 수 있는 내 여유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도, 방구석에서 버티기를 하고있지 않는 상황이. 한숨대신 추워서 나온 입김이.